
독자 박진경
고령으로 귀농했음에도 대가야에 대한 나의 관심은 무척 얕았다. 고령 문인회의 소개를 통해 이 소설을 접했을 때, 사료라곤 거의 몇 줄밖에 남아있지 않은 대가야라는 나라를 어떤 식으로 이 책에 녹여낼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강한 호기심이 일었다.
이 책의 여주인공 곡옥은 화려하도록 아름답고, 야심차며 진취적인 인물로, 온화하고 사려깊은 회령과는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곡옥은, 자신의 앞에 놓인 잔혹한 운명과 비극 앞에서도 나라를 책임지는 그림자 여왕이었다. 현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저 잔인하게만 생각되는 순장 풍습을 고집하는 모습에서, 나는 그녀가 마냥 악녀라고만 생각되었다. 그렇기에 나는 마지막까지 그녀를 옹호하지 않은 채 소설 ‘곡옥’을 읽어나갔다.
그러나 내용이 진행될수록, 나는 그녀가 이해되고 급기야 그녀의 속내에 공감하게 되었다. 마지막 장면이 가까워오면서는 눈물이 터져나왔고, 그것은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땐 거의 호흡이 불규칙해질 정도의 울음이 되었다. 나는 뭐에 홀린 듯 컴퓨터 앞으로 다가가 디지털 드로잉 프로그램을 열고 타블렛 펜을 쥐었다. 머릿속에서, 말로는 표현해내지 못할 여러 느낌이 어떤 여자의 형상으로 다가고 그걸 어떻게든 밖으로 꺼내놓아야 한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나는 곡옥이 지닌 이목구비의 형태에는 거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그녀로부터 받은 그 깊은 영감을 표현해내는 것에만 온 신경을 쏟았다. 그녀를 묘사해내기에, 나의 표현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신의 인생을 대가야에 모두 바치고 그 무거운 숙명을 기꺼이 짊어졌던 한 여자의 비극적인 삶에 눈물을 흘리며 작업을 이어갔다.
다음날, 나는 푸석한 얼굴로 책을 쓴 작가 선생님을 만나뵈었다. 그 꼴을 하고도 꼭 뵈어야 했다. 나 또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인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었던 건지가 너무나 궁금했다. 허구의 인물에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은 격렬한 동요를 느끼고 그 끝은 결국 먹먹할 정도의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런 기이한 경험은 처음이었다.
순장이란 악습을 지켜나가는 캐릭터에 공감해 밤새 울고, 강렬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가야는 곡옥을 빼놓고서 쉬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되어버렸다. 정견모주의 화신이었고, 대가야였던 곡옥의 굴곡진 삶은 마치 화인을 찍듯 내 마음 깊은 곳에 큰 족적을 남겼다.
6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개정판을 받아들었다. 그 때의 그림이 책에 새겨진 걸 보며, 나는 영광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왠지 모르게 운명적인 느낌을 받았다. 곡옥이 실제 살아있는 사람마냥 책으로부터 또박또박 걸어나와 현대의 내게 건네는 말들은, 지극히 모순적이지만 나에게는 실제같은 이야기였다. 운동 삼아 한여름의 녹음으로 물든 주산능선을 오르고 있노라면 늘 곡옥과 함께 걷는 듯하다.
‘우리들에게 가야사는 더 이상 복원이 불가능한 원형질로만 남겨져 있었다. 그런데 『곡옥曲玉』을 통해 역사의 저편에 깊이 매몰된 가야인의 삶의 한 켠이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는 오직 이수정 작가가 오랫동안 가야사의 한 편린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역사적 상상력 덕분이다.’ 라고 평론한 남송우 교수님의 말처럼, 곡옥이라는 잊지 못할 인물을 만나게 해 준 이수정 작가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주간고령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지면 평생 구독 50만원 / 연간 구독 5만원 / 월 구독 5천원
- 농협 301-0218-8409-31 주간고령
계좌번호 복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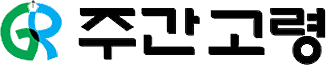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http://weeklygr.com/data/file/news/thumb-662292049_73GUMhAr_d0a629b314c19e547601fbdba1fe21f8934d6b2a_190x1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