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万 折<문필가>
‘부뚜막에 앉힌 아이’ 같던, 불안불안하던 정국이 행안부 장관 탄핵 불을 지펴 재미를 봤는지 또 김건희 등의 ‘쌍특검’으로 번졌다. 야당 법무장관 질의 중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혼동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궁했는지 ‘그게 뭐 중요하냐’로 반격했다. 좀 얍삽하지만 ‘이모’를 꺼낼 수밖에 없다.
핼러윈 참사 때 처음부터 나는 한두 고위직은 법적보다 도의적으로도 책임지는 이가 없어 실망했다. 하지만 야당도 국익보다는 ‘집단적 이익’에만 매몰되어 못할 게 없는 ‘공룡야당’이라는 무소불위의 행태에는 그 역시 실망이다. 발의 계획할 때만 해도 2~30여 명은 역풍이 불 것이라며 반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돌았는데, 극렬 방탄대가 일일이 전화하며 반대 이유를 밝히라는, 엄포를 놓는다. 입만 열면 쏟아내는 ‘헌법기관’의 위상은 어디로 갔으며, 극소수의 정치적 소신(올곧은 소리)은 하루아침에 사상누각이 돼버려 참 씁쓸하다. 언론은 ‘다수결의 테러···’, ‘폭군’이라 직격했다.
‘개딸들’과는 달리 법가(法家)들은 인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 걸 보면 역시 초유의 관심이다. 제발 정권 호불호를 떠나 국정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라도 장관 탄핵 인용은 없었으면 좋겠다. 의석 다수의 권력에만 취하지 말고 나라 앞길도 좀 돌아보길 엄중히 축격(逐擊)한다.
‘꼰대’나 하는 소리, ‘법이 추상같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를 또 흘리게 한다. 주요 사건의 법원 판단은 판사의 성향 따라 희비가 갈린다는, 웃지 못 할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니 말이다. 정의·공정의 소신뿐만 아니라 ‘권력 지향’의 외풍(인맥)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라! 세계가 인정하는 ‘K팝’ 등의 나라에 상식의 법치가 없어서야···.
그런데 윤미향 사건과 이른바 ‘50억 클럽’의 1심 판결이야말로 누가 봐도 성향이 좌지우지하는 판결이었다. 2년 반을 뭉그적거린 위안부 돈 횡령 사건도 무죄이고, 곽상도의 뇌물혐의는 아들이 독립 생계이니 그 또한 무죄였다. 윤미향의 그 돈, 말하기도 소름 돋는 그들(위안부) ‘노후 안정’을 위한 돈인데, 그걸 갈비 먹고 커피 마시며 내 돈 쓰듯 해놓고도 항소 운운하니 이런 후안무치가 어디 있나. 벌금만 내면 무죄라니, 이거야말로 ‘성향 따른 재판’이라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수사 부실, 법원은 솜방망이니 흑막(?)을 의심케 한다. 벌금형만 받은 윤미향의 환히 흘리는 희희낙락은 또 무슨 심보인가. 고인 되신 분이나 살아계신 분(위안부)들의 절규를 웃음으로 깔아뭉개겠다는 패악질인가. 인간의 탈을 쓰기나 했나? 그런 데다 이재명은 윤미향을 향해 ‘검찰이 악마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억울할까’라 하고, 당은 ‘미안···’ 릴레이다. 게다가 검찰 비판만 하니 ‘그 나물에 그 밥’인가, ‘약자동행’인가? 선량한 국민의 판단은···.
권력 편향 없는 사정기관은 우리 헌정사에 한 번도 없었다. 폭정의 자유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많은 사건들이 이른바 ‘뒷배’에 따라 좌지우지 됐음은 역사가 증언한다. 특히 문 정권일 때 박범계와 추미애가 가장 심했다. 정권에 비판적일 땐 한직으로 내몰고 순치(馴致)된(?) 판검사만 자리보전시켰다. 신념(정의)도 무색하고 뒷배의 비호세력만 보는 판검사들의 업무 수행은 정상적일 수 있었을까. 특히 정권은 바뀌었지만 신·구세력끼리의 불화(혼란)가 수면위로 떠오른 게 아닌가 한다.
그 우려가 바로 상식에 반하는 ‘50억 클럽’에서 나타났다. 그 ‘5인들’이 모두 당시 대법관 등 고위직과 유력 인사들이니, 아들 곽병채를 기소하는 날엔 나머지 ‘4인들’도 똑같은 단죄를 하긴 정말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다. 그 파장은 경천동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쪽저쪽 거센 논란에 휩쓸릴 게 아니라 무난함을 택하는, 세속에서 쓰는 ‘좋은 게 좋다’가 아니었을까 한다. <다음에 계속>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주간고령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지면 평생 구독 50만원 / 연간 구독 5만원 / 월 구독 5천원
- 농협 301-0218-8409-31 주간고령
계좌번호 복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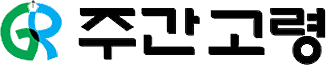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http://weeklygr.com/data/file/news/thumb-662292049_73GUMhAr_d0a629b314c19e547601fbdba1fe21f8934d6b2a_190x1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