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상조(시인·소설가)
영순은 작은 돌을 하나 집어 들고 일부러 호수의 가장자리에 툭 던졌다. 작고 힘없어 보이는 물결이 일었다. 그러나 그 물결은 힘을 잃지 않고 달이 있는 곳까지 거뜬히 가서 달을 나뭇잎처럼 일렁거리게 했다.
자신도 무엇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영순은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감격인 듯 눈물 번진 눈자위와 어설픈 웃음의 입 모양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느껴져 얼른 바위에 다시 걸터앉으며 볼에 번진 눈물을 두 손으로 훔쳤다. 그 때였다. ‘삐-이’ 하고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아!”
영순은 흐르는 피조차 정지시킨 듯 꼼짝 않고 귀를 곤두세웠다. 또다시 ‘삐-이’ 하고 날카로운 듯하면서도 오히려 처량한 소리가 들렸다. 휘파람새였다.
천평골에서 듣던 그 새소리였다. 처음엔 꼭 밤에 울던 탓에 ‘밤새’라고 부르다가 동생 경순이가
“언니, 밤새보다 휘파람새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
하고 말했었다. 그래서 자매는 그때부터 ‘휘파람새’라 불렀는데, 언뜻 그 모습까지 본 적이 있다.
늦은 밤 두 자매가 천평골의 우물가에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눌 때 그 특유의 울음을 울며 ‘푸드득’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까치보다는 좀 더 큰듯하면서 특히 날개가 유난히 길어 보였다. 그때 동생과 둘이서 밤에 울고 다니는 그 새가 너무나 처량하게 보여서 그 새소리만 들으면 괜스레 가슴한구석이 미어짐을 느꼈었다.
‘여기도 사는구나. 그런데 어째서 지금껏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오늘 처음 들은 걸까.’
언뜻 재우 오빠의 목소리가 귀에서 살아나는듯하여 영순은 그것을 털어내듯 머리를 옆으로 흔들어댔다.
‘안 돼! 안 돼!’ 하고 속으로 외쳤다.
다시 그 싹이 돋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마음을 비워내려고 머리를 흔들었다. 영순의 원천적 바람이었던 것처럼 오빠에 대한 생각들은 밭에서 뽑아 던진 쇠비름과 같았다. 볕에 시들시들 다 죽어 가다가도 비만 오면 이파리 하나가 살아나고 잔뿌리 중 하나는 땅에 그 끈질김을 박아 넣는 것이었다. 그래서 밭에 일을 할 때는 뽑아 놓은 쇠비름을 오며가며 발로 차서 한 달 넘게 비가 안 와야 비로소 죽는 것이었다.
그 같은 오빠에 대한 생각이기에 머리를 흔들며 몰아내고 있었다.
“삐-이” 하고 한참 만에 휘파람새가 다시 울었다.
여동생의 안타까워하는 얼굴이 달 뒤에 겹쳤다가 구름 한 점에 지워지고 있었다.
영순은 벌떡 일어섰다.
‘나는 오동나무를 닮을 거야. 속을 비워 버린 오동나무가 되어 그 비워진 속만큼 욕심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영순은 단호한 걸음걸이로 집을 향해 걸었다. 달은 호수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높은 하늘을 당겨 움직일 줄 몰랐다.
마당의 양지쪽 담장 아래 국화가 노란 빛깔을 햇볕에 반사시키고 있었다. 영순은 햇살을 등으로 느끼면서 쪼그리고 앉아 국화의 꽃잎을 보고 있었다.
‘사람도 꽃처럼 살 수 있다면…….’
고운 꽃잎을 보면서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동물은 먹고 나면 버리는 것이 있는데 꽃은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인지 버리는 것이 없다. 어느 신선이 저렇듯 귀하게 살 수 있을까.
거기다가 땅속 어디에서 뽑아내었는지 황홀한 향기까지 피워내지 않는가.
땅속에 사는 흙의 정령들이 있어서 땅 위의 사람들을 위해 보내는 선물인가 하고 생각되었다. 그 때 갑자기
“안녕하십니꺼?”
하고 누가 대문을 들어서며 힘있게 인사를 했다. 영순은 엉겁결에 벌떡 일어섰다.
“아! 예.”
하고 인사를 받으며 손을 이마로 가져갔다. 빈혈증이 일면서 눈앞이 캄캄해 사실 누군지를 알아볼 수 없었다. 눈앞이 아니라 머릿속이 먹물을 덮어쓴 듯 캄캄하게 느껴졌다.
이마에 있던 오른손으로 햇볕을 가리며 눈이 부셔 못 알아본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다. 그사이에 환하게 눈앞이 밝아져 보이면서 키 큰 남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읍에서 행정서사 사무소를 하는 사람이었다. 마을에서 누가 땅을 사거나 팔기라도 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사람이었다.
“어쩐 일이세요. 저희 집에…….”
놀란 듯 바라보는 영순에게 그 남자는 조금은 징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 집 신랑이 오라꼬 전화가 와서 안 왔심니꺼. 집에 있심니꺼?”
“예. 방에…… 들어가 보세요.”
영순은 방문을 가리켰다. 그 남자는 영순을 향해 능글맞게 씽긋 웃고는 방으로 향했다.
“동생! 요새는 몸이 좀 어떻노?”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일부러 전화를 해서 불렀다는 말에 신경이 쓰였다.
사과를 깍아서 체면치레로 차려 준 영순은 할 일도 없으면서 마당을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었다. 양복을 입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는 저 사람들만 없으면 어느 시골동네도 평화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 저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면 동네가 술렁거리고, 자고 나면 땅주인이 바뀌어 있었다.
저녁 바람이 차가웠다. 갓 피어 오른 국화의 속살이 아픔을 느낄듯한 밤 기온 이었다. 남편의 눈길이 오늘따라 더 한층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다.
TV를 보던 남편이 영순에게로 흔들림 없는 표정을 하고 바라보았다. 그 표정이 워낙 견고해 보여 영순은 흠칫 놀라면서 무안한 듯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친정에 한번 다녀오우.”
느닷없는 제안에 영순은 기쁘기도 했지만 의아심이 함께 일었다. 남편은 그 표정을 읽은 것 같았다.
“장인어른께 사위 노릇도 못 했는데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전해 드리고 싶어서…….”
영순은 이제 이해가 간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호에 계속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주간고령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지면 평생 구독 50만원 / 연간 구독 5만원 / 월 구독 5천원
- 농협 301-0218-8409-31 주간고령
계좌번호 복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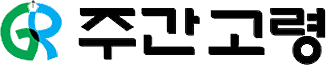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http://weeklygr.com/data/file/news/thumb-662292049_73GUMhAr_d0a629b314c19e547601fbdba1fe21f8934d6b2a_190x1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