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상조(시인·소설가)
<지난호에 이어>
구원파 본원에서 전국의 매스컴이 실시간 생중계를 하는 가운데 그의 실명을 현수막으로 내걸었기 때문이었다. 현수막의 내용이 시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유 목사 자신과의 커넥션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때문에 상대는 협박으로 느낀 나머지 그것이 분노로 바뀔 수가 있어 은근히 염려가 되어 오는 것이었다.
별장의 불이란 불은 모두 소등한 가운데 두 사람은 금수원의 신 선생이 오기를 기다렸다. 양 기사가 급조한 2층의 세 평 남짓한 비밀 공간에서 전화 벨소리가 울리기만을 기다렸다. 김 집사가 정확한 정보라며 오늘 밤은 무조건 숨어 있어야 된다고 은밀한 통보가 있었기에 숨어서 신 선생을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두 사람은 각자 하나씩 가방에 기대어 눈을 감은 채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잠이 들 듯 말 듯 할 때쯤 양 기사의 휴대폰이 잠시 울리다 꺼지기를 세 번까지 반복이 되었다.
“신 선생이 도착했습니다.”
양 기사는 급히 보고하듯 내 뱉고는 1층으로 내려가 정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했다. 유 목사도 1층으로 내려와 세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정원의 외등이 거실의 벽면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간접조명이 나름 안락하게 느껴졌다.
“신 선생, 밖의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유 목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질문을 하자 신 선생은 30대의 젊은 여성에게 어울리지 않게 긴 한숨을 먼저 내쉬었다.
“지금 검경은 물론이고 군인까지 동원되고, 전국적으로 반상회까지 열어 난리도 보통난리가 아닙니다. 이 나라 최고 권력이 우리를 완전히 압박을 해서 분해시키려는 의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으로 이번 사고에 대한 자신들의 과오를 묻으려 하는 것이죠.”
듣고 있던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다. 새로운 희망은커녕 오히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소식뿐이기 때문이었다.
“신 선생은 여기서 며칠만 고생을 좀 해 줘야 되겠네. 오늘은 분명 어느 쪽에서라도 수색을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 둘은 2층 비밀공간에 가 있을 테니까 신 선생이 알아서 조치를 해 줘.”
두 사람은 신 선생이 가져온 먹을거리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비밀장소로 들어가면서 보니까 자신들이 봐도 감쪽같았다. 창고에 오래전부터 있던 합판과 송판을 사용했기 때문에 급조한 표시는 전혀 나지 않았다. 세 평 남짓한 공간에서 두 사람은 그 엄격하던 수직관계가 자연스럽게 옅어지고 있었다. “목사님, 이제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무슨 수단을 쓸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야 돼.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 창구가 마련돼야 되겠지.”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겠죠?” “이 일은 인간의 문제야. 하나님은 이런 일에 관여하시지 않아.” 양 기사는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떤 급박한 일이 있어야 나타나는 것인지, 생각나지 않는 생각 속으로 멍하니 빠져들고 있었다. 유 목사는 말이 없는 양 기사를 바라보며 자신의 체면에 밀려 별 뜻 없이 내일의 일을 얘기하려 입을 열었다. “선이 닿으면 중국으로 밀항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야 해. 그곳에서 제2의 본당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저 사람들과 흥정은 포기하신 겁니까?” “왠지 불길한 생각이 들어. 워낙 예측 불가한 부류의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달리 길이 없다면 타협을 시도하는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챙겨놓은 가방은 너무 큰 것 같지 않습니까? 이동할 일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저 큰 가방을 남 몰래 옮기기에는 좀…….” “저 가방 안에는 우리를 지켜줄 세 가지가 들어 있어. 어느 한 가지도 포기할 것이 없어. 첫째가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켜줄 돈이고 둘째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위협받을 상황에서 꼭 필요한 총이지. 비록 경기용 공기총과 구식 권총들이긴 하지만 충분히 인마살상용으로 가능해.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수호신은 저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인데 검은 거래장이야.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지.” 양 기사는 머리를 끄덕이면서도 어느 한쪽은 포기하면서 짐을 줄이는 것이 현명 할 것 같은 생각을 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양 기사는 차를 갖다 버리고 와. 수사에 혼선이 오도록 장례식장 같은 곳이 좋겠지?” 그때 차량의 엔진소리가 가까워지다가 멈추고 차량의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뒤 요란하게 새의 지저귐이 2층까지 울렸다. 초인종 소리였다. 두 사람은 올 것이 왔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며 온몸이 굳어버렸다. 한참을 울린 초인종 소리는 그치고 남자의 음성이 두런두런 들려왔다. 두 사람은 창문이 없는 공간이라 순전히 소리에만 의존해서 바깥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다.
“누구세요?”
신 선생이 현관을 나가면서 고함을 질렀다.
“경찰입니다. 공무로 왔으니 문 좀 열어 주세요.” 그 순간 ‘찰칵’하고 정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숨소리마저 죽이며 귀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이 순경, 플래시로 안쪽을 비춰 봐. 한번 둘러보고 가는 거지 뭐 누가 바보같이 다 소문난 별장으로 도망 오겠어. 안 그래?” “그러게요.”
<다음호에 계속>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주간고령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지면 평생 구독 50만원 / 연간 구독 5만원 / 월 구독 5천원
- 농협 301-0218-8409-31 주간고령
계좌번호 복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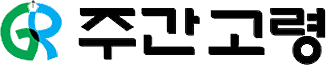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http://weeklygr.com/data/file/news/thumb-662292049_73GUMhAr_d0a629b314c19e547601fbdba1fe21f8934d6b2a_190x1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