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경(일러스트, 웹툰 작가)
<지난호에 이어>
“그러면 아껴야 하는 것 아니냐. 재미는 있었지만, 이런 것을 보며 남은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향후 정말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을 찾아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럼 일단 꺼둘게요.”
나는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폰의 전원을 완전히 내렸다.
“아저씬 무슨 일 해요?”
“나는 백성이 도둑이나 무뢰배 등으로 위험에 처하지 않는가 살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전쟁이 나면 전쟁에도 참여하지.”
“그럼 칼싸움 발하겠네요.”
“목검으로 수련은 늘 하고 있다만··· 아무래도 시대가 평화롭다 보니 진검을 써서 전력을 다해 싸울 일이 없어 실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이 잘 되지 않는구나.”
“그렇구나··· 아저씬 자식 없어요?”
···아내가 아이 낳다가 난산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아이도 곧 따라갔고.“
“···죄송해요. 괜한 걸 물었네요.”
“괜찮다.”
“참, 아저씨 몇 살이에요?”
“나는 스물 둘이다.”
“···예에에에????”
“왜 그러느냐?”
“전 아저씨 마흔은 되신 줄 알았어요! 어쩌다 그렇게 폭삭 늙··· 아니, 어, 음···”
“내가 특별히 남들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은 아니다. 너희 시대에는 사람들이 나이보다 젊게 보이는 모양이구나.”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아저씨가 사는 집으로 향했다. 아저씨의 집은 산자락에 위치해 있었는데, 지도 어플상으로는 지산리 즈음이었다.
“돌아갈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이곳에서 지내야 할 터이니 너도 이곳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거라. 내가 도우마.”
“고마원요, 덕수 아저씨.”
“내 이름은 덕수가 아니라 호권이다.”
“네, 덕수 아저씨.”
아저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니 문갑 같은 것 안에서 철로 된 갑옷을 주섬주섬 꺼내어 손질하기 시작했다.
“이거 알아요! 갑옷이죠?”
“그렇다, 철로 만들어진 것이지.”
“네, 보면 알아요.”
“놀라지 않는 것이냐? 철로 만든 갑옷이란 말이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늘···”
“철은 흔하지 않나요? 요즘에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많이 쓰던데.”
“···스테··· 뭐라고? 그게 무엇이냐?”
“녹이 안 스는 철이요.”
“철에 녹이 슬지 않는다고?”
녹이 스는 철 같은 걸 누가 써요.“
“허허··· 네가 이 갑옷을 보고도 놀라지 않는 연유가 다 있는 것이었구나. 미래에는 철로 만든 물건이 그렇게 흔해 지다니··· 그것도 녹이 슬지 않는 철로 만든 것이라··· 어떤 시대인지 나로서는 상상이 잘 가지않는구나. 이 시대의 철을 생산하고재련해내는 기술은 나라의 국력을 상상할 만큼 그 중요도와 위상이 대단한 것이거늘···실상 철을 다룰 수 있는 나라도거의 없다고 알고 있다만···”
철로 만든 갑옷을 자랑하려는 기색이었다가 약간 시무룩해진 듯한 아저씨를 위해,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근대 우리 시대엔 이렇게 멋진 갑옷 같은 건 없어요. 그리고 아저씨 어제 보니까 길다란 칼도 갖고 있던데 그거 저 한 번 보여주면 안돼요? 저희 시대엔 칼이라곤 거의 부엌에서 쓰는 짧은 거나, 아니면 종이나 뭐 잡다한 거 자를 때 쓰는 조그만 칼이 전부이거든요. 그런 애니메이션에나 나올 것 같은 엄청난 칼은 실물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전쟁에 나가서 막 휘두르면 되게 멋있을 거에요. 막 이렇게 쥐고선 휙 하고···”
“멋있는 거 아니다.”
“네?”
“칼에 밴 상처 본 적 있나?”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안 보는 게 좋을 거다. 전쟁은 무섭고 끔찍한 거야. 가끔 태평성대밖에 못 겪어 본 어린 놈들이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고 쉰소리를 해대는데, 사람이 떼로 다치고 죽어 나가는 건 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운 일이야. 너처럼 어린아이들조차 죽거나 고아가 되고, 연약한 아녀자들이 노역과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시름시름 병드는 게 전쟁이다.”
“전쟁을 겪어 본 적이 있어요?”
“큰 전쟁 같은 건 아니었다만··· 왜와 무역을 하던 곳에서 한 번 소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그때 동료와 친구들을 몇 잃었지. 그들이 쓰러지며 내질렀던 비명이 아직도 잊히질 않는다. 그날 그들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딸린 식솔들의 인생까지 모조리 도륙당했지. 그래서 난 왜놈들이 싫다.”
내가 왜가 어디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벽에 기대어 놓은 목검을 들었다.
“진검은 보여줄 수 없다. 무릇 검은 든 자는 칼집에서 검을 꺼낼 때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법이지. 대신 이걸로 잠시 놀자꾸나. 이걸로 내개 조그마한 상처라도 낼 수 있다면 내 네게 선물을 하나 주마.”
“우와, 진짜요? 아 근데 저 선물 노리고 아저씨 다치게 하긴 삻어요.”
“날 다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니 대단한 자신감이구나!” 네가 그렇게 세어 보이진 않는다만.“
“아, 저 무시하지 마세요! 태권도 2년 다녔거든요!”
“미래의 권법 같은 것을 수련했나 보구나. 그렇다고 네가 단련된 대가야의 장정을 다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저도 하면 한다고요!”
나는 눈을 질끈 감고 기다란 목검을 휘둘렀다. 혹여 아저씨가 다칠까바 있는 힘껏 휘두르지는 못했다.
“···나와 장난을 하자는 것이냐? 네가 사는 시대에는 사내들조차 근성이고 근력이고 모조리 퇴화해 버렸더냐?”
“와, 이 아저씨 어그로 장난 없네. 그렇게 나오신다 이거죠, 그렇다면 게임으로 다져진 폭력성의 무서움을 보여 드릴 수밖에요!”
<다음에 계속>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주간고령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지면 평생 구독 50만원 / 연간 구독 5만원 / 월 구독 5천원
- 농협 301-0218-8409-31 주간고령
계좌번호 복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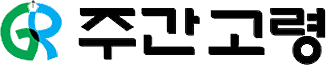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http://weeklygr.com/data/file/news/thumb-662292049_73GUMhAr_d0a629b314c19e547601fbdba1fe21f8934d6b2a_190x1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