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万 折<문필가 >
귀지는 지금 “고령지방의 마을史”를 연재하고 있어 관심 있게 보고 있다. 특히나 지명 연혁에서 생성 연원(淵源)을 밝히고 순 한글의 토속어까지 쓴 것을 보니, 우리 옛 선조들이 쓴 ‘말과 글’의 쓰임새의 그 일면을 깨닫게도 한다. 새 터전을 일궈 살았다고 새터(한자표기-新基)인데, 이 지명은 우리 법산에도 있고 골골마다 있다. 팔산리는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봉우리가 여덟 개가 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고, 당산은 마을의 안녕을 비는 신당(神堂)이 있어 붙은 이름, 독전은 옛날 이곳서 옹기를 생산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이 마을에서 시집 온 새색시 택호는 ‘독점댁’으로 불렀으니 정오(正誤)는 어디일까?
제일 정감이 가는 지명은 꽃질이다. 법산에서 냇물만 건너면 닿는 가까운 동네이기도 하지만 거기 친인척이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특히 절강시씨(浙江施氏) 집성촌이기 때문이다.
절강시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인명사전에도 등재돼 있고 성주의 역사 문헌에도 올라 있는 시문용(施文龍) 장군이다. 그는 명나라 절강 출신인데 임진왜란 때 조선 원군(援軍)으로 왔다가 전공을 세웠으나 신병을 얻어 명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조선에 귀화하여 터를 잡은 곳이 성주였다. 선조 임금이 그의 전공을 치하하여 첨지중추부사를 제수하였으며, 군사뿐만 아니라 풍수와 의술에도 능하여 광해군 때는 정인홍(鄭仁弘)의 추천을 받아 궁궐 및 왕릉 축조사업에도 참여했다. 이로 인해 광해군 정권이 몰락했을 때는 전 왕조 때 토목공사를 일으켜 백성을 가렴(苛斂)했다는 치죄(治罪)에 연루됐으나, 처형을 면하여 현 용암면 대방동에 은거하며 단(壇)을 쌓아놓고 매달 삭망(朔望) 때는 향을 피우고 네 번 절하여 고향을 기렸다 한다. 영조 임금 때는 병조참판에 증직되었으며, 그의 저서로는 ‘풍천집(風泉集)’ 등의 시문집이 있다.
결실, 거여실, 거리실 등의 여러 지명 중 어슴푸레히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다. 어렸을 적 어른들로부터 ‘거러실···’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말만 들었을 뿐 짐작이라도 가는 곳은 전혀 없었던 것 같다. 또 이곳은 대가야국 때 축조한 운라산성(雲羅山城)이 있다는데, 이 운라산성에 우리 선조 한 분의 묘소가 ‘운라산방’에 계시니 더욱 관심이 가기도 했다.
고령 하면 대가야국을 떠올리고 이 대가야국을 지키기 위한 요새지에 산성을 쌓았다니 신라 6가야 중 대가야국의 세력과 위상을 미뤄 짐작하게 한다. 근년에 와서는 가야국의 상징인 “대가야읍”으로 격상하여 大가야국의 본령(本領)으로 복원하기도 했다.
또 꽃질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둘일까만 제일 먼저 화암장이 생각난다. 시장의 연원은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던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물물교환을 하던 보부상(褓負商)이었다 한다. 그 보부상이 조선시대에 와서는 공인(公認) 상설시장인 육주비전(六注比廛-약칭 육의전.六矣廛)으로 발전하였고, 그것이 지역단위의 5일장의 효시(嚆矢)가 아닌가 한다. 인구가 늘어나고 생산과 소비의 규모가 커지니 다 수용하기 어렵기도 하고, 거리상 적소(適所)라고 생각하여 화암장을 연 것으로 알고 있다. 처음 장이 열리던 날 개장 기념으로 농악대가 ‘지신(地神)밟기’ 행사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다음은 화암 버스정류장이다. 내 기억으로 6.25 전에는 버스라곤 없다가 휴전 직후부터는 군용차 GMC(타이어가 6개라 속칭 ‘육발이’)가 후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장꾼들을 실어 날랐으며, 한참 후는 하루 상하행(삼한과 삼천리) 버스가 네다섯 번 정도 있었는데, 치열한 손님 유치 쟁탈전도 있었다. 장날은 승객 정원은 있었지만 ‘콩나물시루’가 적절한 표현이었다.
고향 얘기는 언제 하거나, 또 언제이건 듣기만 해도 따뜻한 어머니 품속 같아 정감이 넘친다. 나는 비록 안태 고향은 성주 법산이지만 고령이 오히려 고향이라 느낄 때가 더 많다. 그것은 법산 앞 시내만 건너면 고령이기 때문이다. 열두어 살 때부터 엄마 따라 고령장을 드나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쌀이나 보리쌀 한 말 짊어지고 장에 걸어가서 팔고 그 돈으로 호미, 낫 살 때도 있었으며, 갈치나 혹은 꽁치 서너 마리 사서 짚으로 묶어 들고 20리도 넘는 길을 걸어오면 3,4월 긴긴날 해동갑을 할 때가 다반사였다. 그것도 열대여섯 살일 때는 여간 허기가 져도 요기는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집까지 걸어 왔다. 어쩌면 그게 한낱 ‘여행’의 의미일 수도 있으니 추억의 고령장날이었다.
스무 살 전후일 때 어느 날 장에서 동네 친구 시병주(施炳柱)를 만났다. 바로 위에 언급한 시문용 장군의 후예였다. 한동네이지만 사는 뜸이 달라 평소 자주 볼 수 없다가 만 리 객지(?) 장터에서 만나니 반가움이 더했으며, 그 친구에 끌려 돼지국밥집에 갔다. 그 친구 덕에 점심 한 그릇 잘 얻어먹었던 기억이 새롭다. 나는 부모 슬하에 살았기 때문에 지전 한 푼도 맘대로 쓸 수 없었지만, 그는 맏아들로서 상당한 재량권이 있었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그가 덕곡으로 장가갈 때 나는 초례청(醮禮廳)에서 축사를 낭독하기도 했었다. 지금 생각하니 꿈만 같던 세월이 아련히 떠오른다.
오늘의 인류 문명사는 변전에다 반전을 거듭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반세기도 전의 고향 풍정(風情)을 떠올리자니 그야말로 ‘만감 교차’일 뿐이다. 굳이 말한다면 여우는 죽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 살던 곳 언덕 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수구초심이 그나마도 적절한 말일 수밖에 없다. 정히 그렇다면 나는 갑자기 여우가 되고 말았구먼, 허참······?!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주간고령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지면 평생 구독 50만원 / 연간 구독 5만원 / 월 구독 5천원
- 농협 301-0218-8409-31 주간고령
계좌번호 복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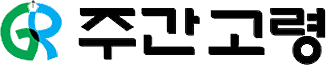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http://weeklygr.com/data/file/news/thumb-662292049_73GUMhAr_d0a629b314c19e547601fbdba1fe21f8934d6b2a_190x1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