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산김씨 문충공파 회장 김 년 수
“법령이란 백성을 선도하기 위함이고 형벌이란 간교한 자를 처단하기 위함이다. 법문과 집행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착한 백성들은 두려워한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잘 수양한 사람이 관직에 오르면 문란한 적이 없다. ‘직분을 다하고 이치를 따르는 것’ 또한 다스림이라 할 수 있다. 어찌 위엄만으로 되겠는가?”
작금의 나라 안팎의 상황은 최악이다. 리드라는 공직자는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론을 통합해야 함에도 국론은 둘로 쪼개져 있고, 도덕상, 법률상 문제가 있어 국민이 반대하는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하여 사법개혁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조국 말고는 사법개혁 할 사람이 없는지 묻고 싶다. 집권 여당도 타는 불은 그대로 둔 채 끓는 물만 식히려는 방식의 정치를 하고 있으니 준엄하고 혹독한 수단을 쓰지 않고 어찌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사사로운 욕심에 물들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을 떠받들면 법의 근본적인 기능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다. 요컨대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려는 관리의 의지와 자기수양이 전제된다면 법은 얼마든지 너그러워질 수도 있다는 논리다.
‘군도(君道)’에 보면 “어지럽히는 군주는 있어도 어지러운 나라는 없다.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잘 다스리는 법은 없다”는 대목이 눈에 띤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갖추어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법과 제도는 유명무실해진다. 처음부터 어지러운 나라는 없다. 못난 리더가 자리에 앉아 제도와 법을 어지럽히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법을 유린하기 때문이다. 법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이 법을 가장 많이 어기고 악용하는 까닭도 그 사람의 법의식이 삐뚤어져 있고, 사사로운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대 노나라의 재상을 지낸 박사 공의휴는 나라의 녹을 먹는 공직자들은 백성과 이익을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몸으로 실천했다. 즉, 돈을 많이 받는 공직자가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차지하기 위해 백성들의 이익을 갉아 먹는 파렴치한 행동을 끔찍하게 혐오했다. 백성들의 존중을 받는 만큼 그 책임을 다하라는 철학을 몸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공직자로서 아주 사소한 물건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누군가 공의휴에게 생선을 보내왔다. 하지만 공의휴는 생선을 돌려보냈다.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다. 지금 내 녹봉으로도 생선 정도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런데 생선을 받기 시작하다가 파면되고 나면 누가 다시 생선을 보내겠는가?”라고 말했고,
진(晉)나라의 사법관 이리(李離)는 누군가의 거짓말을 듣고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을 판결하여 그 사람을 죽게 했다. 사법부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셈이다. 그러자 이리는 자신을 옥에 가두게 하고 자신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당시 통치자였던 문공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건 이리의 잘못이 아니라 이리 밑에 있는 실무를 담당한 부하의 잘못이니 자책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이리는 이렇게 말했다. “신은 담당 부서의 장관으로서 관리에게 직위를 양보하지 않았고, 많은 녹봉을 받으면서 부하들에게 이익을 나누어주지도 않았습니다. 판결을 잘못 내려 사람을 죽여 놓고 그 죄를 부하들에게 떠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라며 스스로 자결하여 사형을 대신했다.
나라를 이끄는 공직자들의 행태들이 가관이다. 직분을 다하고 이치에 따르는 공직자는 그만두고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추한 모습까지 다 보이고 있으니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 여럿의 삶을 망친 판결을 내린 파렴치한 판사들, 권력자의 눈치만 보면서 적폐를 핑계로 선량한 국민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기소하는 검찰 등의 행태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법이 통치의 수단이나 도구가 되긴 하지만 인간의 선악과 공직의 청탁을 가늠하거나 결정하는 근본적인 도구는 될 수 없다. 그 유력한 근거로 치밀한 법망을 갖추고도 통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던 진(秦)나라의 빠른 멸망과 가혹하고 치밀한 법망을 가지고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한 무제의 통치 사례를 느껴야한다.
* 사외(社外)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주간고령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지면 평생 구독 50만원 / 연간 구독 5만원 / 월 구독 5천원
- 농협 301-0218-8409-31 주간고령
계좌번호 복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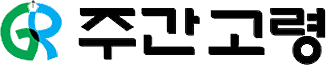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http://weeklygr.com/data/file/news/thumb-662292049_73GUMhAr_d0a629b314c19e547601fbdba1fe21f8934d6b2a_190x1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