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는 광활리에서, 나는 구만리에서
수필가 윤 영
아들은 어저께 집을 떠났다. 며칠 전부터 뜬금없이 지평선이 궁금하다나 뭐라나. 전주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하룻저녁을 유하고 김제평야로 갈 거라고 했다. 오늘 아침 광활면 지평선로라는 낯선 지명이 적힌 이정표 사진을 보내왔다.
뜬금없기는 나도 마찬가지인가. 불쑥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갑자기 수평선을 보러 가자는 나의 말에 그는 이유도 묻지 않았다. 싱크대에 설거짓거리가 수북했지만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 옷가지를 챙겨 입고는 달아 빼듯 현관문을 나섰다. 사실은 아들이 엊그제부터 지평선 이야기를 들먹일 때 약간의 호기심이 인 것은 사실이다.
영일만을 에둘러 석병에 들자 봄비가 듣는다. 구만리 청보리밭은 아직 청년이다. 들바람이나 들까 한 좁은 길을 따라 내려가자 사각기둥과 노란 지붕만 얹어놓은 이층 주택이 정적에 휩싸였다. 묵묵해졌다. 차를 돌려 갯바위가 섬처럼 이어진 길을 따라 달린다. 생소한 마을들을 지나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섰다. 짙푸른 파도의 골이 깊다. 얕은 모래펄에 섬섬한 물새들이 우르르 내려앉는다. 어미 새가 가다 멋기를 반복하는 동안 어린 새들이 소품 같은 유화를 찍으며 맹랑하게 따라 간다. 말이 없던 친구가 “저 새는 자식을 많이도 뒀네.”라며 웃는다. 먼 곳으로 향했던 눈길을 거두어들이자 비로소 눈앞에 뒤엉킨 철조망과 무덤이 들어온다. 밋밋한 봉분을 잔뜩 뒤덮은 민들레와 으스러진 ‘통제구역’ 푯말이 고립무원이다. 운무에 갇힌 수평선이 뿌옇다.
몸이 축축하다. 아들은 지평선을 만났을까.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점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평야에서 만난 지평선 사진을 보내왔다. 사진 풍경이 저녁밥을 짓는 엄마의 표정같이 수더분하다. 그곳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한풀 꺾인 해를 걸쳐 놓고 수만 평의 보리 이랑이 파도치듯 누워 있다. 전봇대가 나란히 세워진 마을을 배경으로 희미하게 교회 종탑과 먼 산이 푸르다. 땅 위이 요철이나 경사 때문에 지평선을 만나는 일이 그리 쉬운 게 아니라고 들었건만, 그러고 보면 지평선도 서로가 이를 드러내며 경계를 긋는 선이 아니다. 하늘이 땅과 바다를 품어야만 가능한 일이잖은가.
나와 아들은 어느 한때 서로에게 스며들지 못했다. 아이는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욕심이 컸다. 굳은살이 박여도 너무 크게 박혔다고 해야 할까.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자신의 침대에 압정을 뿌려 놓고 공부를 했었다. 졸음에 겨워 누울까 봐서다. 그럼에도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는 말없이 머리를 홀딱 밀고 입영 열차를 기다리는 군인 같은 모양새로 현관문을 들어섰다. 때로는 혼자서 해운대로 가는 기차를 타거나 세계패션축제장으로 사라지기도 했다. 그런 아들이 섬뜩하리만치 무서웠다. 말없이 학교로 가 버리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자 얼마나 울었던가.
이렇듯 녀석과 나의 삶의 방식은 뒤엉켜만 갔으니, 나는 그저 까탈스럽지 않게, 두루뭉술하게 살아가기를 바랐다. 자신을 닦달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간이 갈수록 열어졌어야 할 아가미를 꽉 닫고 헤엄치는 물고기였다. 우지끈했으며 가늠이 되지 않았다. 적어도 내 눈에는 자체를 옭아매는 올가미처럼 보였다.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집에 오는 시간이 더뎠다. 이 사회에 도태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불쑥불쑥 해맑아야 할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런 밤이면 남편과 나의 가슴에서는 늘 병 하나 깨지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이들은 그 당시 모든 게 시고 떫었을까.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와서는 한 달가량 배낭을 짊어지고 유럽 여행을 다녔다. 품이 폼 나게 큰 녀석이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는 말이 있다. 미성숙한 엄마를 뒀으니 대들지도 못하고 오죽 속이 탔을까. 그러고 보면 나는 녀석의 꿈을 가망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무시하기 일쑤였다. 잔인하게 표나지 않게 밟아 갔다. 그렇다면 정말이지 아이가 대충대충 이 사회에 섞여 살아도 괜찮았을까. 참 무책임했다. 누구의 조련사도 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나붓나붓하게 마음을 읽어 주는 자애로운 엄마가 되지도 못했다. 살아내 가는 방향은 달랐지만 추구하는 길은 같음을 이제야 알았으니 이제 와서 말한들 뭣 하랴.
녀석은 지평선에서 무얼 만나고 돌아올까. 광활한 꿈을 안고 드넓은 세계로 뻗어 갈 길을 개척하고 오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아이는 힘들 때마다 여행하면서 불쑥불쑥 어른이 되어 가는 관문을 통과해 왔다. 이제 두어 달 후면 뉴욕에서의 생활이 시작된다. 꿈꿔오던 일이었지만 만사가 순조롭지만은 않음을 안다. 하늘과 땅의 껴안음을 보려고 광활리로 떠난 아들, 하늘과 바다의 껴안음을 보기 위해 구만리로 떠나온 나는 결국 나란히 뻗은 길을 따라 서로에게 스며들다 보니 그곳이 소실점이었고 종착지였다.
더러는 독 오른 감자 같으면 어떤가. 멀찍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되도록 많은 것들을 품어 보라고 되뇐다. 지금쯤 아들은 지평선을 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 몸을 실었을 것이다. 나도 슬슬 일어나 짐을 챙겼다. 파도 더미 너머 망망한 수평선을 두고 집으로 돌아간다.
작가 프로필
영덕 출생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에서 인성교육학 전공
2005년 ‘한국수필’로 등단
계간 문장 편집위원
2017년 대구문인협회 ‘올해의 작품상’ 수상
수필집 ‘사소한 슬픔’, ‘아주 오래 천천히’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주간고령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지면 평생 구독 50만원 / 연간 구독 5만원 / 월 구독 5천원
- 농협 301-0218-8409-31 주간고령
계좌번호 복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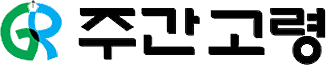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http://weeklygr.com/data/file/news/thumb-662292049_73GUMhAr_d0a629b314c19e547601fbdba1fe21f8934d6b2a_190x1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