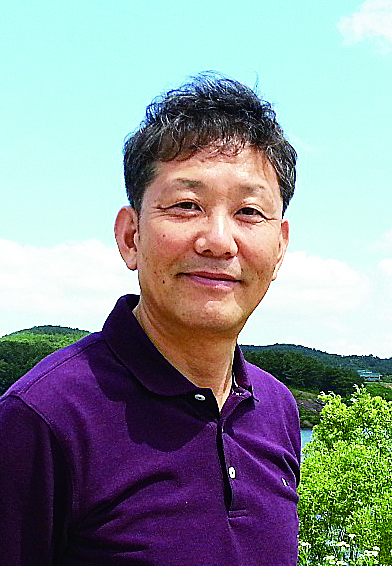
요즘은 각종 언론매체마다 CVID가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 CVID)를 뜻한다.
이제 이 단어는 핵에 관련된 전문용어라기보다 정말 핵전쟁이 일어날까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 확실하고 증명할 수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라는 표현을 가만히 곱씹는다.
아주 오래 전 우리 집 안마당에선 핵전쟁 대신에 생쥐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건 분명 처참한 살생 현장이었다. 목숨을 내주어야 하는 자와 목숨을 거두어야만 되는 자와의 의식이 이른 아침 침묵 속에 진행되고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달콤한 미끼의 유혹은 무서운 법일까. 쥐망덫 안에 놓인 미끼에 걸려들었던 생쥐들의 눈동자가 아직도 생생하다. 사람의 살의를 느꼈음인지 놈들은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간단했다. 쥐망덫과 갇힌 쥐를 물로 가득 채워진 양동이 속으로 함께 넣어 서서히 가라앉히는 게 전부였다. 물속에 들어가게 된 놈은 덫에서 뛰쳐나올 구멍을 찾아 필사적으로 헤엄쳐보지만 벗어날 방법이 없다. 작은 망 사이로 주둥이를 있는 힘껏 내밀어 숨을 쉬어보려 하지만 어림없는 건 마찬가지이다.
쥐가 뱉은 공기 방울은 수면 위에 둥근 원을 그려낸다. 숨이 더욱 가빠진 놈은 자신의 네발로 철선 덫 망을 끊임없이 긁어댔다. 마치 100미터 트랙을 질주하는 육상 선수처럼 대가리를 치켜세운 채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렸다. 다만 땅 위가 아니고 물속이었다는 사실만 다를 뿐이다. 다시 몇 개의 공기 방울이 떠오르고 격렬하게 밀어 대던 움직임도 슬슬 둔해진다.
비록 환영받지 못한 미물이라 하지만 산목숨 줄이 이토록 질긴 걸까? 찰나의 순간은 억겹같이 길기만 하다. 입이 마르고 손바닥에 땀이 난다. 어린 나를 올려다보는 까만 눈동자가 눈물겹도록 초롱초롱했다. 쥐에게 말했다. “아… 어짜노!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슬픔과 원망으로 가득 찬 눈을 애써 외면했지만 이미 기억 속에는 담고 있었다.
이 전쟁과는 상관없다는 듯 조용하게 아침 햇살이 떠올랐다. 물에 잠겨 있던 쥐망덫이 물동이 안에서 ‘타닥타닥!’ 거리며 나직한 마찰음을 낸다. 고통을 끊어내지 못한 마지막 몸부림 소리였다. 마침내 그들은 짧은 경련을 일으키며 부르르 떠는가 싶더니 네 발을 쭉 뻗었다.
이내 천 길 낭떠러지 같은 물동이 바닥으로 천천히 가라앉는다. 더 이상 절망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닷가 마을의 정미소에서 1차 전쟁은 끝났다. 시골 정미소였던 우리 집엔 늘 쥐가 많았다. 쥐들이 갉아 놓은 가마니 사이로 도정 된 낱알들이 흘러 창고 바닥에 즐비했다. 그만큼 손해가 많았다.
한 톨의 곡식도 귀했던 1970년대 한 해 쥐가 먹어 치우는 곡식이 우리나라 곡물 총생산량의 8%에 해당하는 240만석에 이르렀다니 피해가 심각했던 모양이다. “쥐는 살찌고 사람은 굶는다!” 라는 표어가 나붙던 시기였다. 농림부에선 집집마다 쥐약을 나누어 주며 쥐잡기 운동을 펼쳤다. 매년 한두 번 하는 행사지만 우리 집에서는 일 년 내내 쥐잡기를 했다.
이윽고 익사된 쥐는 쥐망덫 문을 열자 물먹은 한지 뭉치처럼 축 늘어져 공장 바닥에 쏟아졌다. 완전한 죽음이다. 그러나 그다음 또 하나의 과정이 남아 있음을 누가 알았겠는가?
아버지는 숨 끊어진 쥐에게 천천히 다가서더니 낡고 뭉텅한 자신의 구두 밑창으로 뾰족한 주둥이 부분을 힘껏 밟아 짓뭉개는 것이 아닌가! ‘아… 아부지요!’ 올려다본 아버지의 얼굴은 무표정이다.
오로지 입을 굳게 다문 채 입술에 힘을 주어 가며 자근자근 짓누르는 동작만 반복할 뿐이다. 이미 죽은 쥐의 날카로운 이빨과 보드라운 잇몸이 아버지의 힘센 구둣발 압력에 파열음을 남기고 짓이겨졌다.
아버지가 무서워졌다. 어린 마음에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다. 찡그려지는 얼굴에 금방이라도 울어 버릴 것 같은 내 표정을 보았는지 위로하듯 한마디 건넨다.
“혹시 쥐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더 이상 귀한 곡식을 못 먹게 해야 해.” 단호한 어조다. 거부할 수 없는 절대 명령처럼 들렸다. ‘귀한 곡식’이라는 말에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서 아버지를 만류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완벽한 소멸을 위한 아버지의 노력이 비장하기까지 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확실한 검증이 또 있을까? 잔혹한 만큼 돌이킬 수 없는 폐기였다. 이렇게 아버지와 쥐들과의 마지막 전쟁이 끝났다.
언제였던가. 아버지는 자신이 겪었던 총각 시절의 한 기억을 이야기해 주었다. 경제적으로 무능력했던 형님을 대신해 어린 조카들을 먹여 살렸다고. 그 당시에는 돈이 있어도 쌀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했다. 지독한 가뭄이 들던 해였다. 아버지는 큰 배낭 속에 비누를 잔뜩 담고 친구와 둘이서 타지방 농가에 들러 비누를 쌀로 바꾸어 오던 길이었다. 터널 속을 걷는데 달려오는 기차를 봤다. 죽음을 눈앞에 둔 둘은 필사적으로 철길 사이 부목 위에 종잇장처럼 엎드렸다고.
기적이란 이런 것인가. 기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터널을 빠져나가고 아버지는 친구와 부둥켜안고 그저 한없이 울었다고 했다. 배고픔은 다시 찾아왔을 테고 아버지는 또 배낭 안에 비누를 쑤셔 넣었을 것이다.
가슴 저린 세월이 바람처럼 지나갔다. 중년의 아버지가 시골 정미소 운영을 하면서 아침마다 쥐와의 한판승을 겨룬 것은 흰 알곡이 전부만은 아닐 것이다. 총각 시절의 눈물겨운 순간들이 떠올랐을 터. 하물며 가난한 이웃의 양식이 아니던가. 놈들이 찢어 놓은 가마니처럼 아버지의 심정도 찢어졌으리라. 당신에게 알곡 하나하나가 눈물이고 생명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나는 여태 하지 못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미 당신은 먼 길을 떠났다. 그 순한 쥐의 죽음에서 숱한 파열음과 마찰음을 봐 왔던 소년은 쥐와의 전쟁 대신 핵전쟁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지구의 어느 곳에선 기아로 허덕이는 세상이 진행형이다. 장마당 좌판 밑에 떨어진 밥알을 주워 먹는 북한의 아이들. 말라비틀어진 팔다리와 부풀어 오른 배에 슬프도록 큰 눈을 가진 아프리카 어린애들은 유니세프 광고 화면에 매일같이 클로즈업되고 있다.
쓸쓸한 저녁이다. 아내가 방금 지어준 쌀밥이 먹음직스럽지만 그다지 입맛이 없다. 대신 어린 날 마주쳤던 까만 눈동자와 본 적 없는 아버지의 비누 배낭이 자꾸만 떠오른다. 비단 당신인들 그 쥐라는 놈들에게 완전한 죽음을 확인하면서 가슴이 아리지 않았겠는가.
필자 김상룡 프로필 - 수필가, 윤영의 문학공간 수료, 고령문협 회원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주간고령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지면 평생 구독 50만원 / 연간 구독 5만원 / 월 구독 5천원
- 농협 301-0218-8409-31 주간고령
계좌번호 복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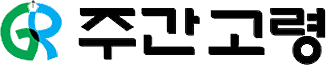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http://weeklygr.com/data/file/news/thumb-662292049_73GUMhAr_d0a629b314c19e547601fbdba1fe21f8934d6b2a_190x1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