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서 상 조(시인·소설가)
<지난호에 이어>
정혜는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형편없어 보이는 지방자치제의 심각한 문제점이 또 하나 있구나 싶었다. 새삼 울컥 치솟는 화를 가라앉히며 술을 거듭 몇 잔을 들이켰더니, 오히려 피곤이 달아나고 박현철에 대한 증오가 밀려왔다. 습관처럼 술로 달래려는 버릇이 나와 술의 양이 늘어나자 연락소장은 오히려 반색을 하며 술을 마시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민양, 여기 있는 동안 나만 믿어. 편안하게 있다가 가도록 해줄 테니. 오늘 희다방에 전화를 내가 했는데, 주인한테 오늘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나하고 있다가 아침에 가는 거야. 외로운 사람끼리…… 응?”
“안돼요. 가야돼요.”
말로만 ‘안 된다’ 하면서 정혜는 오늘따라 이상하게 술이 취할수록 현철에 대한 배신감이 솟구쳐 이 사내가 끌고 가는 대로 내버려 둘 참이었다. 매너도 그런대로 지키는 것 같고, 나이는 들었지만 깔끔한 외모이기에 ‘성김에 서방질’이란 말이 기가 막히게 맞아든다 싶었다. 시간비와 내일 쉴 수 있도록 팁만 해결해주면 썩을 놈의 삶을 한 토막 개주듯 던져주면 그만이라 생각했다.
코 고는 소리에 정혜는 잠이 깼다. 지끈지끈 아픈 머리를 들어보니 연락소장이 입을 벌린 채 술 냄새를 풍기며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 어젯밤 기억이 꿈결처럼 어렴풋이 떠올랐다. 연락소장의 손에 끌려 여관에 들어왔고, 용맹 없는 물건에 정혜는 짜증이 날 정도로 시달리다가 연락소장이 제풀에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들고서야 정혜도 잠이 들었었다.
정혜는 샤워를 하고 옷을 챙겨 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자 서글픔이 물밀듯 밀려왔다.
술에 찌든 민낯의 피부와 퉁퉁 부어 오른 얼굴 살이 정혜 자신도 고개를 돌리고 싶을 정도로 싫었다. 어차피 발을 내디딘 구렁텅이 생활인데 하다가도, ‘희 다방’을 끝으로 옛날의 자신을 되찾아야겠다고 새삼스럽게 또 다짐을 했다.
정혜는 오늘 하루를 쉴 요량으로 술을 퍼 마셨는데, 돈을 받지 않고 그냥 갈 수는 없었다. 어젯저녁 시간비와 오늘 하루치 돈은 입금시켜야 될 일이었다.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연락소장을 흔들어 깨웠다. 연락소장은 술이 덜 깬 얼굴을 찡그리며 부스스하게 일어나 앉았다.
“소장님, 저 지금 가야 되거든요.” 정혜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아이구 머리가 터질 것 같네. 가면 되지 임마! 자는 사람은 왜 깨우고 난리야!” 연락소장은 짜증스럽다는 듯이 내뱉고는 쓰러지듯 침대에 누워 버렸다.
“소장님, 시간비를 챙겨 주셔야 되잖아요.” 정혜의 다소 재촉 하듯 하는 말에 연락소장은 신경질 적으로 윗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야, 임마! 너희 주인이 아무 말 없었어? 원래 어제 같은 자리는 업소 주인이 책임지는 거야.”
“그래도 전 아무 얘기 못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 친구가! 너, 희다방 영업정지 먹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이젠 아예 대놓고 성질을 부렸다. 적반하장도 너무 지나친 경우라 정혜는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혜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연락소장을 빤히 바라보고 서 있었다.
“이 자식이 뭘 째려봐, 다방에나 돌아다니는 계집애가...”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참고 서있는 정혜를 길고양이 취급하듯, 제 마음껏 지껄이고는 돌아 누워 버렸다.
정혜는 할 말을 잃고 연락소장의 뒤통수를 뚫어 버리기라도 할 듯이 바라보았다.
‘이 더러운 사내놈을 칼로 난도질을 해버릴까?’
연락소장의 뒤통수에 박현철의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정혜는 살기가 솟아올랐다. 방안에 무기가 될 만한 게 없는 것이 다행이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대들고 싶었지만 ‘희 다방’의 ‘영업정지’문제가 정혜로 하여금 그 방을 나서게 했다. 읍이라고 해도 조금 큰, 시골마을 쯤 되는 곳이라 걸어서 가기로 마음먹었다. 걷다보니 아침 공기가 정혜의 기분을 조금은 가라앉혀 주는 것 같아 일부러 들길로 들어섰다.
치밀어 오른 화가 가라앉지 않았지만 정혜의 시야에 들어온 5월의 산야는 아침햇볕을 받아 푸른 보석처럼 빛났다. 청 보리밭이 늘어서 있고 밭 가운데는 드문드문 보리이삭이 낱알마다 창을 용맹스럽게 들고 하늘을 향해 무한히 뻗어나갈 기세로 솟아나 있었다.
논두렁의 잡초조차도 그 푸름이 당당해보였다. 이 빛나는 5월의 하늘아래 정혜 자신만이 너무나 추하게 느껴졌다. 운명이라는 것이 별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것이 곧 운명이라고 생각되었다. 사람끼리의 만남이 은혜로울 수도 있지만, 실패한 만남은 푸르른 운명을 일순간 무참하게 꺾어서 짓밟아 버린다는 것을 알았다.
하염없이 걷고 있는 정혜의 두 눈에는 소리 없는 눈물이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명치에 매달려 있던 한이 풀려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박현철’이란 자를 마음에서 쉽게 버리지 못한 어리석음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으니, 원망스러움이 바깥을 휘돌다가 자신에게로 다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걷는 사이 해가 꽤 솟아올랐다.
다방식구들이 출근 했겠다는 생각에 정혜는 들길을 돌아 ‘희 다방‘으로 향했다. 주택가를 들어서면서 정혜는 갑자기 제 몰골이 형편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다방에 들어섰다.
주방 언니는 밀걸레를 들고 열심히 바닥을 밀고 있었다. 주인 언니는 화장을 하다말고
<다음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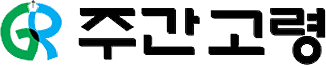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