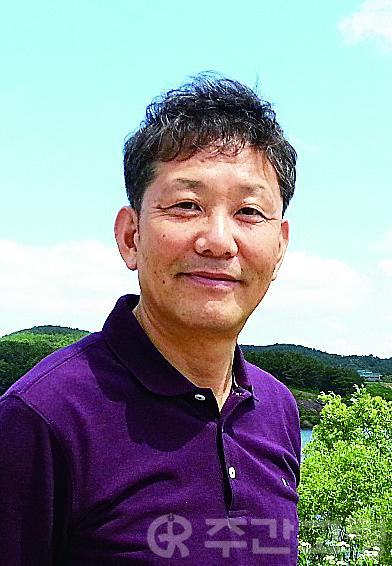
일요일 오후, 나는 매번 무채색이 된다. 문득 ‘의미’라는 단어가 끼어든다. 해석과 평가 사이를 줄타기에 앞서 나에게 의미란 매번 1,067m의 허들로 나타난다. 넘어야 되는 강박이 싫다. 오늘은 어지러운 세상 소식에서 멀어지리라 다짐하면서 해석과 평가가 필요 없는 채널을 돌렸다. 매번 화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한국 청년이 적도의 나라 에콰도르를 소개하고 있었다.
지루해진 여행 프로그램에 눈꺼풀이 무거워질 즘이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연인을 만난 듯 백년지기 친구를 만난 듯 ‘발타사’가 화면에 잡혔다. 당나귀 고삐를 쥐고 있는 그는 여전히 낡고 때 묻은 빨간 판초를 걸치고 있었다. 오늘도 변함없이 침보라소 얼음을 캐러 가는 길이란다. 가끔 그의 안부가 궁금했었는데.
내가 발타사를 처음 본 것은 2년 전 어느 방송사의 특집 다큐멘터리에서다. 칠순 노인이 내려치는 곡괭이가 수천 년 된 빙하 얼음을 흔들어 잠에서 깨우던 첫 장면이 떠올랐다.
“할아버지기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할아버지는 58년간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해발 5천 미터의 산에서 얼음을 캐는 적도의 마지막 얼음 장수입니다.”
발타사 할아버지의 손자인 ‘아르만도’가 무덤덤한 음성으로 더빙하면서 다큐멘터리는 시작된다.
열다섯 살 때부터 얼음 캐는 일을 시작했다는 발타사. 만년설이 보이는 비쿠냐의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는 할아버지도 당나귀도 힘들어 보이기는 마찬가지. 힘듦에도 빠지지 않는 그의 기도가 성스러우면서도 쓸쓸하고 외로워 보인다.신의 가호를 믿으며 무탈함을 애원하리라.
끝도 없는 가파른 길을 걸어 도착한 곳은 풀 한 포기 없는, 돌무더기 가득한 척박한 땅, 그 아래에는 수백 수천 년 동안 녹지 않은 얼음덩어리가 있다. 침보라소의 보물이다.
과거 적도 지역에서 얼음은 귀한 물건으로 대접 받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얼음을 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한때는 오십여 명까지 이른 적이 있었다고 한다. 냉장고가 생기고 얼음을 찾는 수요가 줄자 얼음 장수들도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났다. 이제 발타사 혼자 남아 침보라소를 지킨다.
150센티 작달막한 키에 얼음을 캐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연거푸 가쁜 숨을 몰아쉰다. 그럼에도 탁탁 지축을 뒤흔드는 그의 어깨가 숭고하다. 얼마나 내려갔을까. 눈앞에는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 낸 푸른 얼음덩어리가 반짝인다.
“아주 고된 작업입니다. 힘들고 위험한 일이지요. 나는 압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을요. 부쩍 더 늙어 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도 달립니다.”
외길로만 걸어온 발타사의 고단한 여정이 허허롭다. 언제까지 곡괭이를 잡을 수 있을까. 갑자기 싸락눈이 쏟아지자 그는 서둘러 얼음을 쪼개고 다듬어 산 아래에서 베어 온 ‘빠하’라는 풀로 녹지 않게 감싼 뒤 당나귀 등에 실었다. 무거운 알음을 지고 산길을 터벅터벅 내려가는 당나귀와 할아버지 등 뒤로 싸락눈은 여전히 내린다. 평생을 불평 없이 자신의 발이 되어준 당나귀에 대한 고마움을 그의 눈빛이 말해준다.
이튿날 새벽, 할아버지와 손자는 당나귀를 앞세우고 서둘러 길을 나섰다. 얼음이 채 녹기기 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한다. 10km를 걸은 끝에 도착한 곳은 시내에 위치한 ‘리오밤바’ 시장이었다. 그곳에서도 발타사의 인기는 대단했다. 그를 아는 시장 상인과 행인들이 악수를 청하거나 포옹을 한다. 테라스에서 주스를 마시던 젊은이와 관광객들이 발타사를 모델로 기념촬영을 부탁하기도 했다. 기분이 좋아진 발타사의 상기된 표정에 TV를 보고 있던 나까지 덩달아 어깨가 으쓱거렸다. 처음으로 시장에 따라온 손자인 ‘아르만도’는 할아버지의 인기에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드디어 도착한 곳은 과일주스 가게였다. 주스에 침보라소 얼음을 넣어서 판매하니 시원해서 손님들이 좋아한다면서 아주머니는 발타사와 역사를 함께했다고 연방 자랑을 해 댄다.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발타사와 같이 찍은 사진 간판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다. 이렇듯 그가 캐 온 얼음은 귀한 대접을 받는다.
침보라소 얼음은 이곳 사람들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다. 몸을 깨끗하게 하고 아픈 곳을 낫게 한다고 믿고 있다. 자연스레 할아버지의 얼음은 리오밤바시의 명물이 되었다. 그러나 주스 가게 아주머니는 취재하는 카메라를 향해 자꾸만 걱정을 늘어놓는다. 만약 발타사가 얼음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오랜 전통을 이어 온 음료가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할아버지는 얼음 주스를 마시고 있는 손자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지난 58년 동안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침보라소 얼음을 아직도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것을 슬쩍 보여 주고 싶었던 것이다. 손자는 무엇을 느꼈을까. 할아버지와 손자는 과일 가게를 나와 다시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은 얼음 판 돈으로 손자에게 제대로 된 전통 판초를 사 입히고 싶어서다. 어린 나이에 부모와 헤어진 아르만도를 직접 키웠기 때문이다. 손자이기 전에 친자식과도 같았다.
아르만도는 요즘 부쩍 고민이 깊다. 고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하고 집안일을 돕고 있지만 진로가 걱정이다. 주스 가게 아주머니가 자신에게 “할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서 침보라소 얼음을 꺼내 주면 참 졸겠구나.”라고 부탁했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아르만도는 얼음을 캐러 가는 할아버지의 길을 처음으로 따라나섰다. 얼마 전 발타사가 몇 달 동안 얼음을 팔아 모은 돈으로 아르만도에게 당나귀를 사 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잊었으리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 산을 오르는 게 더욱 힘들어진 할아버지가 걱정되어서다. 또한 얼음덩어리를 캐기 위해서는 침보라소 산을 점점 더 높이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왜 얼음을 캐세요?”
앞서 가던 아르만도가 묻는다.
“침보라소는 나에게 할아버지 같은 존재지. 그래서 매일 이 산을 오르는 거야. 이걸 해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해. 하지만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얼음을 기다린단다.”
발타사는 만년설의 옷을 입고 적도에 우뚝 솟은 침보라소를 경배하듯 올려다보며 다시 말을 이어간다.
“내가 해 온 일이 나를 끝으로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그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불렀던 노래가 되었으면 해. 이 전통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야.”
아르만도는 이제야 할아버지가 산을 올라 얼음을 캐는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다. 할아버지에게 얼음을 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친다는 것이다.
침보라소 산꼭대기 하얀 빙벽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나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내가 죽더라도 이 일이 잊히지 않길…….”
가난하고 노쇠한 인디오 발타사의 마지막 말이 애잔하게 들린다. 석양에 비친 능선 따라 걷는 당나귀들과 고삐를 잡은 아르만도. 그 뒤를 따르는 발타사의 모습이 한 폭의 실루엣이다. 다큐멘터리는 끝났다.
곁에 있던 아내에게 TV리모컨을 넘겨주며 나는 독백처럼 중얼거린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부를 노래가 있겠는가? 혹여 있다면 누가 불러 주려나.”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하고는 “꽃순이를 아시나요! 꽃처럼 어여쁜 꽃순이~ 나의 눈에 이슬 남기고~ 내 곁을 떠나간 꽃순이” 노래를 부른다.
내가 좋아하는 곡이다. 위로를 담은 아내의 노래가 늦가을 숲 속 바람 소리다.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주간고령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지면 평생 구독 50만원 / 연간 구독 5만원 / 월 구독 5천원
- 농협 301-0218-8409-31 주간고령
계좌번호 복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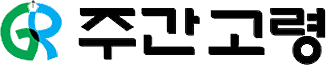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http://weeklygr.com/data/file/news/thumb-662292049_73GUMhAr_d0a629b314c19e547601fbdba1fe21f8934d6b2a_190x1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