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아경(수필가)
따르릉 따르릉, 손만 내밀어 알람을 끈다. 연인의 품 같은 이불 속에서 떨쳐 일어나기란 쉽지 않다. 뭉그적대는 사이 또 울린다. 알람 간격이 10분이니, 10분이란 시간이 그토록 달콤할 수가 없다. 이제 일어나지 않으면 줄줄이 지각 사태가 이어진다. 새벽형인 나에게 아침잠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늘 힘겹다.
알람이 울리지 않는 일요일이 며칠 남았는지 헤아리며 반수면 상태로 세수하고 쌀을 씻는다. 압력밥솥에 취사 버튼을 누르고, 전날 준비해 놓은 찌개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며 ‘일어나라, 밥 먹어라’를 무슨 주문처럼 반복한다. 일어나 밥을 먹고, 준비하는 모습들은 예정된 시나리오처럼 일정하다. 누가 정해 놓은 질서인지 의문도 없이 시계가 지정된 한 지점에 이르자 서둘러 현관을 나선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큰딸의 뺨과 콧등에는 로션이 찍혀있다. 아마도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에 마무리할 것이다. 20분 후, 둘째가 후다닥 나간다. 1분도 지나지 않아 인터폰이 울리더니 체육복을 가져가지 않았단다. 비닐봉지에 체육복을 넣어 묶어서 베란다 밖으로 던진다.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지점이 딸아이가 친구와 서 있는 곳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번번이 일어나는 일이라 둘째도 나도 자연스럽다. 고맙다며 손바닥 뽀뽀를 날리는 딸에게 같은 동작으로 답한다. 흐트러진 식탁을 수습하고 수저를 바꿔 남편과 아침을 먹는다. 신문을 보며 남편이 한마디씩 던지는 불만은 나를 향한 것인지 세상을 향한 것인지 알쏭달쏭하다. 몇 숟가락 뜨고 일어나 주전자에 물을 올린다. 신문 속 세상사를 반찬 삼아 씹어대는 남편 옆에서 나는 커피를 마신다. 잠시 후, 그도 나간다. 또 얼마 후, 나도 나간다. 시계를 보며….
“달리가 대구 온단다. 가자.”
H언니의 상기된 목소리에 그의 명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예술에 관심이 많은 언니는 굵직한 오페라며 전시회가 대구까지 납시었는데 가보는 것이 예의라는 것이었다. 살바도르 달리 탄생 100주년 기념전시회다. 안목이 없는 나는 세계적이라는 그림 앞에서 그 가치를 가늠하지 못해 멀뚱히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눈동자를 동그랗게 모으고 양 갈래 콧수염을 짓궂게 치켜세운 달리의 모습 앞에서 피식 웃고야 말았다. 훤칠한 키에 하얀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맨 모습은 지중해 사나이의 낭만이 물씬 풍겼다. 궤도에서 살짝 벗어난 모습과 옷차림에서 그의 그림세계를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입구에 줄을 서서 팸플릿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둔덕처럼 쌓였던 일상의 짐이 가벼워진다.
큐레이터 옆에서 설명을 듣다 그림 한 점 앞에서 멈췄다. 나뭇가지에 엿가락처럼 녹아 축 처진 시계가 걸쳐있다. ‘아니, 시계가?’ 시계라면 사각형 아니면 둥근형이고, 한 치의 오차도 용납 않는 정확성이 생명 아닌가. 그런데, 헐렁하게 드러누운 시계를 보자 배꼽 어디쯤에 잠겨 있던 본능이 풀리기 시작한 걸까. 감성이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림이 보였다. 탁자 위에도 시계가 늘어지게 누워 있다. 시계들이 파업이라도 하나보다. ‘자유’를 향한 시계의 쟁의는 작업장을 벗어난 듯 해방감을 느끼게 한다. 그런 시계들의 모습이 발길을 멈추게 하더니 마음까지 잡고 놓아주질 않았다. 주황색의 태엽시계 위에 까만 점들은 자세히 보니 개미다. 어제 같은 오늘을 되풀이하듯 개미의 고정된 행렬은 진부하다. 널브러진 시계의 해방감과 곧추선 개미의 성실함은 작가의 의도를 몰라도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개미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내 모습이 얼핏 보였기 때문이다. 정확하고 고정된 것으로 인식되는 시간이 녹아내려 인간의 의식 안에서 의미심장하게 변모하는 〈시간의 단면〉이란 작품 앞에서 나는 시계를 벗어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는다.
시계와 시간은 처음부터 함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한한 시간을 유한한 공간에 저장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시계가 생겼을 것이다. 시계 속에 저장된 시간은 그렇게 현재를 사는 개인의 삶과 동행하게 된 것은 아닐까. 절대자의 위치에 고고하게 서 있던 오벨리스크의 그노몬처럼 손목에 시계 하나 차고, 시간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가 있다. 정확히 맞춘 시계가 느슨한 행동을 잡아준다고 믿으며 일에 대한 약속은 다른 약속보다 우선으로 여겼다. 꽉 짜인 일정은 시시포스의 운명처럼 반복되지만, 빈틈없이 메우고 나면 또 다른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시간은 금이니까. 서둘다 보면 미처 마음조차 챙기지 못하고 몸만 덩그러니 옮길 때가 있다. 그런 날이면 시간은 저 혼자 우두커니 서 있고, 마음은 외진 곳에서 외로움에 떨곤 했다.
『느림의 미학』이라는 책을 단숨에 읽어야 하는 현실이다. 숨구멍이라도 찾으려 했던 느림조차 빨리 끝내야 하는 숙제처럼 쫓기듯 읽고 있는 나에게 시간이란 뭘까. 광활한 우주에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의 가벼움을 부정하고픈 몸부림으로 시간에 집착하고 그렇게 하면 온전히 시간을 가진다고 믿었다. 의심 않고 앞만 보며 가다 달콤한 주변을 놓쳤을 때는 당혹스럽다. 그 당혹감은 시간에 대한 내 관념을 조금씩 헐겁게 한다. 그래야 하는 줄 알았던 질서가, 그런 줄 알았던 시간이 녹아내릴 수도 있음을 말이다. 온 가족에게 시계를 채워주며 정확하게 움직이길 강요했던 의식이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 앞에서 헐거워진다. 뒤늦게 만난 그의 그림이 향기 되어 ‘왜 삶은 밝고 경쾌하면 안 되냐’고 내면 깊은 곳에서 말하고 있다.
수직의 삶에서 수평의 삶으로 시선을 돌려놓은 살바도르 달리는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일상의 시간쯤은 나뭇가지 위에 잠시 걸쳐두고, 햇살 가득한 곳으로 나가보라 한다. 한 줌의 햇살이 창가에 비치는 느린 아침을 맞이하고, 침대 위에서 커피 향을 맡아보라 한다. 시계를 보지 않고 좋아하는 이의 눈빛만 바라보라 한다. 잡으려 발버둥 쳐도 잡히지 않는 것이 시간임을 조금씩 깨달아가며, 시계를 벗어난 시간을 찾고 있는 중이다.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주간고령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지면 평생 구독 50만원 / 연간 구독 5만원 / 월 구독 5천원
- 농협 301-0218-8409-31 주간고령
계좌번호 복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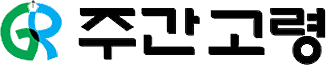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http://weeklygr.com/data/file/news/thumb-662292049_73GUMhAr_d0a629b314c19e547601fbdba1fe21f8934d6b2a_190x1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