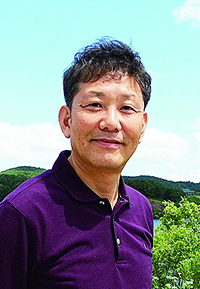
김상룡
“이제 사는 게 지겨워졌어!” 엊그제 식탁에서 뱉은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께까지 통증으로 수반되어 온다. 나는 공원에 나가 팔걸이가 있는 긴 벤치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았다. 계산된 과정과 그에 따른 기대치 한 점 없이 앉아보니 편하다. 격렬한 전투에서 패한 뒤 무장해제당한 병사의 심정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일요일 이른 아침 동네 공원은 고요하기만하다. 느린 걸음으로 산책하는 노부부 외에는 인적이 드물다. 다만 내가 앉은 벤치 건너편에 아들과 아버지로 보이는 두 사람이 벌이는 농구 시합 소리만 간간이 들려올 뿐이다.
“당신이 나랑 사는 거?” 아내가 나지막이 물어온다. 얼굴엔 절제된 웃음이 엷게 번지고 있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부엌 싱크대 쪽으로 돌아선 아내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개수대 물 밸브를 최대치에 설정한다. 설거지할 물이 폭포수처럼 거세게 튀긴다. 씻겨지는 그릇들이 개수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분명 한 옥타브가 높다.
한 치 어김도 없이 반복되는 일상이 갑갑해서일까? 마음씨 너그러운 아내에게 응석받이처럼 칭얼대고 나면 속이라도 시원해지려나 싶어 걸친 말이 오히려 벌집 쑤셔 놓은 꼴이 되고 말았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농구 시합을 하던 아버지가 넘어졌다. 농구장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위험하긴 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이 없다. 중학생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멋쩍은 듯 일어서고 있을 때였다. 그 순간 근처에서 배드민턴 운동을 하고 있었던 어린 여자 초등학생과 사십 초반의 여자가 달려왔다.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 날아온 듯하다. 몸을 추스르는 아버지 곁에는 가족이라는 이름들이 소복하다. 마치 저격당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경호원들처럼 순식간에 아버지를 에워싸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모든 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는 게 믿기질 않는다. 그런데 부축된 아버지가 일어나는 모습이 어찌 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올라간 바짓자락 아래로 남자의 의족이 보인다. ‘그래,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날아서 왔던 거야.’ 아침 햇살에 환하게 웃으며 서 있는 남자의 의족이 건물 공사 시 기둥 철재로 쓰이는 H빔처럼 견고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가족이었다.
아내는 일주일 내내 말이 없다. 나 역시 말 한 톨 건네지 못하고 있다. 식탁에 앉아서도 국물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폭풍 전야가 감지된다. 따지고 보면 내 가난한 언어의 살림살이가 빚어낸 것이지만 입 안에서 맴도는 ‘미안해’ 라는 단어는 쉬이 나오지 않는다. 그깟 미안해, 화 풀어, 오해야 이깟 단어들이 무어 그리 품을 게 있다고 내 속을 꽁꽁 쟁여 놓고 풀어내질 못하는지. 오해를 풀어 이해로 가는 길은 가시밭길보다 험난했다. 어느 구름이 비를 안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나도 아내가 언제 또 비를 내릴지 가슴이 답답하다. 답답함을 핑계로 다시 공원으로 나간다. 폭풍 같은 설거지 소리가 뒷전을 훑었다.
다시 그 의자에 앉는다. 누가 보면 내 돈 주고 사 놓은 의자인 줄 알게다. 저녁만 되면 떡하니 앉아 오징어 다리에 캔맥주를 마시고 있으니 말이다. 아내의 오해가 풀릴 때까지 당분간은 이곳에서 나를 다독이는 작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베란다 불빛이 따습게 보이는 밤이면 아내의 종알종알 애교 섞인 목소리가 그립기도 했다. 드디어 그들이 왔다. 어쩌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여전히 그 풍경을 본다. 일 년은 족히 되지 않았을까. 다리 한쪽이 마비되어 절름거리는 남편 곁엔 항상 키 작은 여자가 있었다. 바싹 붙어 부축하며 운동을 시키는 여자의 얼굴엔 ‘나 힘들지 않아요. 나에겐 이 사람이 최고예요.’라는 다소곳하면서 환한 표정이 묻어난다. 젊은 아내의 헌신적이고 끈질긴 노력이 눈물겹다. 부부는 오늘도 지극히 밑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고 풍경화 한 점을 남겨 주고 돌아갔다. 가로등에 비친 둘의 그림자가 멀어진다. 밤이 이울자 벤치가 가시방석이다. 집으로 돌아가야지.
아내의 신발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아직 헬스장에서 돌아올 시간이 아니다. 일용할 양식을 챙기듯 아내가 냉장고에 챙겨 놓은 와인을 마신다. 삶이란 하루하루가 치열한 전투다. 상처 나지 않는 곳에서 진하게 흘러내리는, 피땀이 만들어낸 시간의 흐름이다. 나는 그것을 말하고 싶었다. 힘들다고, 지루하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내에게 낭창거리며 넋두리를 했던 거라고, 팔자 좋은 신세타령이나 하는 나를 아내는 용서해 줄까.
일요일의 공원은 소설처럼 길지도 않은, 시처럼 짧지도 않은 딱 수필 한 편이다. 죽음처럼 고요하다가도 순식간에 함성으로 탄생하는 곳이다.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다거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신혼부부들의 눈 맞춤이 있다. 건장한 청소년들의 농구 시합이나 놀이터를 꽉 메운 어린아이들이 있다. 갓 쩌낸 옥수수를 봉지에 담아 먼저 나온 할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할머니가 보이고 베란다 밖을 향하여 “건우야 저녁 먹으로 들어와.”라는 젊은 엄마가 있다. 날을 세운다는 일은 칼날이 무뎌졌기 때문이며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면 보이지 않게 그를 힘들게 했을지도 모른다.
일요일마다 만나는 두 가족은 맨드라미보다 붉은 사랑이다. 톱니 모양의 닭볏을 치켜세우고 헐뜯고 쪼아대지 않는다. 사상누각이 아닌 견고한 빔으로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가만 생각해보면 아내는 늘 나에게 산 버팀목이었다. 가벼운 언어의 살림살이를 경박해하지 않았다. 내일쯤엔 묵직한 와인 한 병을 사 달라고 졸라나 볼까.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별일 없이 평탄하게 사는 게 고마운 거더라구.’ 아내에게 들려줄 말을 준비해 놓고 현관문이 열리길 기다린다.
작가 프로필 / ‘윤영의 문학공간’ 수료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주간고령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지면 평생 구독 50만원 / 연간 구독 5만원 / 월 구독 5천원
- 농협 301-0218-8409-31 주간고령
계좌번호 복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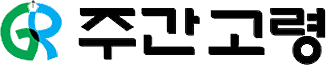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http://weeklygr.com/data/file/news/thumb-662292049_73GUMhAr_d0a629b314c19e547601fbdba1fe21f8934d6b2a_190x1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