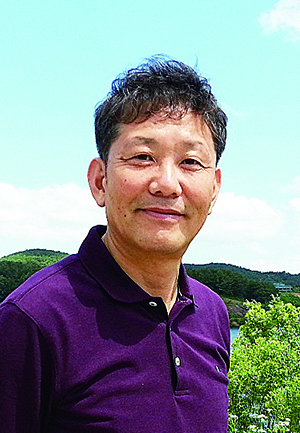
김 상 룡
“엄마! 동네 사람들이 그러던데 우리 아파트 앞에 큰 마트가 생긴데.” 저녁시간을 넘겨 집에 들어온 딸아이가 알코올 냄새를 슬쩍 흘리며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 변명 대신 방어용 인사인 셈이다. 그 순간 나는 왜 아파트 상가에 있는 자그마한 ‘나들가게’ 노부부 얼굴이 떠올랐을까? 나들가게는 코흘리개 아이부터 노인네들까지 심심찮게 들락거리는 동네 슈퍼마켓이다. 나지막한 키에 유독 배만 볼록 나온 할아버지는 늘 잔잔하게 웃는다. 노년이 평안해 보였다. 무릇 세상살이가 그러하듯이 근심 없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소리 없이 나타나는 절벽 하나쯤은 있는 법. 집 앞에는 큰 마트가 생긴다는 소문이 물무늬처럼 동네로 번져 나갔다.
나는 가끔씩 나들가게에 간다. 가벼운 지갑에 내가 사는 물건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 소주 한 병, 캔맥주 한 개, 스낵과자 한 봉지다. 오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건네면 할아버지는 동전 몇 개를 내 손에 얹어 준다. 어느 날부터였을까. 계산대를 지키던 할아버지의 표정이 희미한 전등만큼이나 어두워져 갔다. 나는 넌지시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냥 버릇처럼 챙기던 물건에 하나씩 더 챙기고 있었을 뿐. 평소 먹지도 않는 간식용 크림빵까지 계산대에 올려놓는다.
가게 문을 나서려는 찰라 등 뒤에서 자동차 경적 같은 소리가 내 귀를 번쩍 뜨이게 했다. “감사합니다!” 항상 미소로 답하던 할아버지가 오늘따라 출입문까지 따라 나와 허리를 구십도 가까이 숙이며 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 갑작스런 친절에 적잖은 당황스러움도 잠시, 길 건너 큰 마트에선 나들가게를 집어삼킬 듯 산더미 같은 물건으로 진열대를 채우기 시작한다. 물건을 고를 때 노부부가 도란도란 나누던 이야기가 불쑥 떠올랐다. “우리도 이제 조명을 더 밝게 하고 진열 구조도 확 바꿔야겠어.” 라던 그들의 대화가 오래도록 귓가에 머문다.
드디어 큰 마트가 문을 열었다. 인산인해를 이룬다. 아내도 구경삼아 둘러보니 물건 종류도 많고 가격도 괜찮은 편이라고 한다. 게다가 편하게 입을 옷까지 판매한다고 하니 분명 전문적인 장사꾼임은 틀림없어 보였다. 나는 식구들에게 마치 후방지원군 사령관 쯤 된 듯이 엄명을 내렸다. “우리 동네에선 무조건 나들가게만 이용해라.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말이다.” 강자의 독식과 약자의 절망을 먼 동화나라 얘기처럼 들려주면서.
사활을 건 그들의 경쟁은 시작되었다. 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다. 구경꾼이란 원래 약자의 편에 서서 응원하는 게 더 흥미로워지는 법이다. 어찌 보면 처음부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겠다는 심사가 아닌가. 나는 속으로 나들가게가 큰 마트를 상대로 작은 고추가 맵다는 사실을 보여주길 응원했다.
아니나 다를까 개업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마트 안은 그루터기만 남은 논바닥처럼 썰렁했다. 내 눈이 의심스러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적였던 사람은 온데간데없고 겨우 한두 명의 손님만 어슬렁거릴 뿐, 서너 명의 직원과 사장은 한가로이 물건만 정리하고 있었다.
큰 마트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 이게 뭘까? 의문 속에 부싯돌처럼 번쩍이는 게 있었다. ‘작은 동네에 웬 큰 마트야?’ 갸우뚱하던 아내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수요를 잘못 예측한 결과인 셈이다. 결국 큰 마트는 두 달 만에 문을 닫았다. 어린 다윗이 무릿매로 던진 돌멩이가 거인 골리앗의 넓은 이마에 깊게 박힌 꼴이다. 덩달아 내 기분까지 맑다. 승리는 나비효과처럼 번지나보다.
그렇게 나들가게는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있었다. 예의 그 대나무 비질 소리가 이렇게 반갑게 들린 적이 있었던가. 오늘도 새벽 운동을 마치고 오다 보니 할아버지는 제 몸보다 큰 대나무 빗자루로 슈퍼 앞길을 쓸고 있었다. 노인네답지 않게 탄탄한 어깨를 가진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짐짓 모른 척 “앞집 마트는 왜 장사를 그만뒀데요?”라고 물었다. 엷은 미소를 짓는가 싶더니 불현 듯 크게 웃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하하…….” 발가락에 박힌 가시라도 뽑아낸 듯 웃음소리가 시원하다. 절벽을 건너온 자신감이 묻어난다.
햇살이 따사롭다. 봄이 시작되려나보다. 블랙커피 한 잔을 내밀던 아내가 느닷없이 또 소문을 듣고 왔다. 이번에는 문 닫은 마트자리에 24시 편의점이 생긴다고 한다. 더 강력한 경쟁자가 황야의 무법자처럼 나타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 일을 어쩔 텐가. 지금쯤 나들가게 노부부는 한숨짓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노년에 이게 무슨 산 넘어 산이란 말인가!’ 롤러코스터 같은 세상이다.
아내의 말이 맞았다. 24시 편의점 간판에 노란불이 켜졌다. 딸아이가 새로 생긴 편의점에 간식거리를 사러 갔다가 나에게 가벼운 핀잔을 들었다. “작은 가게에서 사라니깐……….” 아빠의 말에 딸은 오히려 웃으며 편의점을 이용하는 이유를 조곤조곤 설명했다. 마트와 편의점은 그들만의 특징이 있으니 걱정 말란다. 논리적으로 궁색해진 나는 딸에게 더 이상 참견하지 않았다.
저녁이 농익어간다. 밥을 먹듯 소주를 사러 간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예전처럼 웃으며 맞아 주는 노부부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질문의 뜻을 금방 알아차린 할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답한다. “그럭저럭 돌아가니 고마 여기서 뼈를 묻으라는 팔자인가 봅니더. 편의점은 젊은 사람들이 가고 우리 가게는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짬뽕입니더. 그카이 서로 먹고사는 거지요.” 너털웃음을 친다. 공생하는 지혜라도 생긴 걸까. 아니면 편의점 사장과 신사협정이라도 맺은 것일까. 나들가게와 24시 편의점 사이 동거가 꽤 오래갈 것 같다. 검정 비닐 속 소주가 달달해 온다. 또 하나의 산을 넘고 있는 노부부 등 뒤로 금호강이 붉다.
작가 프로필
‘윤영의 문학공간’ 수료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주간고령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지면 평생 구독 50만원 / 연간 구독 5만원 / 월 구독 5천원
- 농협 301-0218-8409-31 주간고령
계좌번호 복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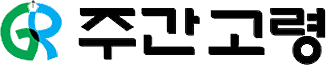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http://weeklygr.com/data/file/news/thumb-662292049_73GUMhAr_d0a629b314c19e547601fbdba1fe21f8934d6b2a_190x143.jpg)










